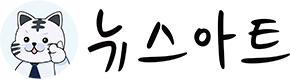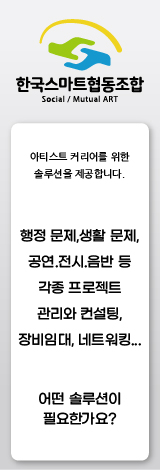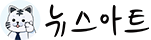곰방대하나로 장터바닥을 지휘하던 야채 파는 할매는 내 동무였다.
장(場)에 왔다는 신고를 하지 않고,
어슬렁거리다 마주치면 긴 곰방대가 여지없이 내 등짝을 내리쳤었다.
영동장에 가면 삼각대와 카메라 가방을 맡겨놓고,
점심도 한 숫가락씩 나눠 먹고,
막걸리 한 사발로 세상을 다 가진 듯,
할매와 나는 해가 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놀았었다.
허나, 지금은 사진만이 남아
곰방대할매와 나의 시간은 촘촘하게 짜여진 그물처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준다.
1991년 어느 장날 오후,
바람이 일어 배춧잎 하나가 팔랑거리는 풍경을 놓치지 않았던 그날 처럼,
수직으로 흘러내린 한겨울의 햇살이 내 창가에 내려와 앉는다.
오늘 할매 사진을 보고 있자니, 두고 온 내 고향 언저리처럼 서럽다.

(글.사진/장터사진가 정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