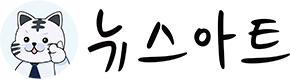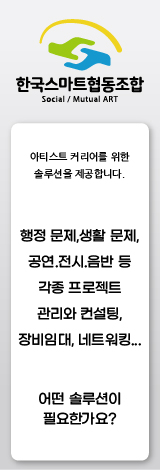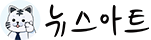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박영희 작가의 작은 그림 몇이 모여 이루는 공간을 조용히 응시해보면, 스치듯 지나가는 붓질을 담은 식물 형태가 주는 생동감이 건조한 공간으로 기분좋게 번져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캔버스는 수성안료의 물기를 담고, 천의 결이 드러나는 얇고 간결하고 빠른 속성들도 잘 품고 있습니다. 화면 위의 원초적이면서도 미시적인 상태들, 이를테면 붓질에 튕겨져 나온 작은 점같은 물감의 응결들, 색이 겹쳐질 때의 미묘한 층위들, 화면을 덮은 안료를 나이프로 쓸듯 걷어내어 자연스럽게 형성된 숨구멍같은 간격들에게도 눈길이 머뭅니다. 그 모양들이 조화롭게 모여져 이루어내는 것이 창밖의 고즈넉한 풍경과 클로즈업 된 잎사귀, 창가의 싱그러운 화분들입니다.
도시의 사람들은 집과 집 사이에 나무를 심고 햇볕 드는 창가에 화분을 놓는 당연함에 익숙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주변의 환경을, 화가는 특별한 기교없이 그 풍경과 물상들을 화면에 담아냅니다. 그런데 그 심플한 의도와 결과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를 일깨우는 듯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림그리기의 허망함 앞에 서보았던 자의 표정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시간과 방법을 가하여 잡으려 했던 실체가 더 이상 회화적 본질로서의 실체감이 아님을 느낄 때 절망할 수 밖에 없었겠지요.
결국 작가는 대상의 형태가 아닌 마음에 다가오는 형태를 그리기로 한 듯합니다. 마치 그림그리기의 허망함 저편으로 가보려는 간절함이 새로운 길을 열어준 듯합니다. 화면은 과거보다 더욱 단순해지고 원초적인 흔적들을 과감하게 남기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작가의 예술적 관점을 더욱 실감나게 합니다.
그리하여 작가의 공간에 담담하게 자리잡은 식물성 미감은 번잡함을 잠시 멈추게 하는 고요한 몰입의 미덕이 있으며, 보는 이의 의식 공간마저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