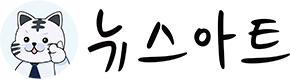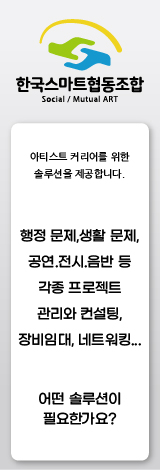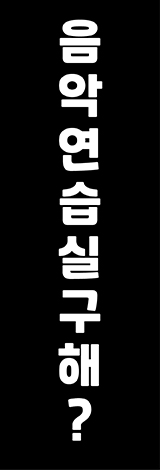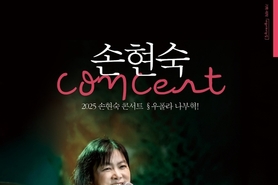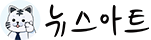뉴스아트 편집부 | "은행 창구에서 저는 '무직자'였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상담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죠. 결국 연 20%짜리 카드론을 돌려막다 불법 사채까지 알아봤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꺼진 후, 40대 연극배우 A씨가 털어놓은 현실은 K-컬처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이야기는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예술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겪는 구조적 폭력의 생생한 증언이다.
지난 11월 5일 국회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폭력의 실체가 데이터와 통계로 모습을 드러냈다. 양문석·임오경·전현희·조계원 의원실 주최로 열린 'K-문화, 그 뿌리는 단단한가?' 토론회는, 우리가 열광하는 K-콘텐츠의 뿌리가 어떻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를 고발하는 자리였다.
'배제 → 약탈 → 파괴', 시스템이 설계한 절망의 3단계
이날 공개된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2025 예술인 금융 재난 보고서』는 한 예술가가 금융 시스템에 의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배제-약탈-파괴'의 3단계로 분석했다.
1단계, '배제': 시작은 제도권 금융의 외면이다. 예술인 10명 중 8명(84.9%)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득 불규칙', '증빙 불가'라는 낡은 잣대는 성실하게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이들을 잠재적 부실 채무자로 낙인찍었다.
2단계, '약탈': 은행에서 밀려난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약탈적 금융 시장이었다. 응답자의 절반(48.6%)이 연 15% 이상의 고금리를, 7.8%는 폭력적 추심이 동반되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3단계, '파괴': 결국 빚의 무게는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채권 추심을 경험한 예술인의 88.3%가 창작 활동을 중단하거나 현저히 위축됐다. 한 편의 시와 한 곡의 노래가 빚 독촉 전화에 짓밟히는 순간, K-문화의 미래 자산도 함께 소멸되고 있었다.

"틀린 것은 예술가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95%가 증명한 진실
이 절망적인 보고서 위로, 한 줄기 빛과 같은 데이터가 제시됐다. 바로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 지난 3년간 진행한 '예술인 상호부조 대출'의 '상환율 95%'라는 기록이다.
신용점수가 아닌 동료의 신뢰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이 작은 사회적 실험은, "예술인은 위험하다"는 금융권의 오랜 편견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통렬하게 증명했다. 첫 발제를 맡은 서인형 이사장은 "이 수치는 틀린 것이 예술가가 아니라, 예술가를 담아내지 못하는 낡은 금융 시스템이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힘주어 말했다.
15억으로 100억을 만드는 '연대의 마법', K-금융의 미래 될까
이날 토론회는 수치뿐인 고발을 넘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서 이사장은 민간과 공공이 30:70으로 1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금융기관에서 100억 원의 대출 한도를 이끌어내는 '민관협력 금융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막대한 정부 예산 없이도 '관계'와 '신뢰'를 기반으로 금융 소외 계층을 구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다.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 역시 "정부가 위험을 나누고 민간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사회적 금융의 방식"이라며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도 깊은 공감을 표했다. 2011년 故 최고은 작가의 비극 이후, 우리는 K-문화의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그 성장의 토대를 이루는 예술가들의 삶은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다.
'상환율 95%'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그것은 시스템으로부터 '무직자' 취급을 받았던 예술가들이 스스로의 존엄과 신뢰를 증명해낸 반격의 기록이다. 이제 이 작은 반격이 K-문화의 뿌리를 되살릴 거대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 사회 전체가 답해야 할 시간이다.